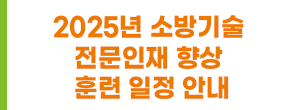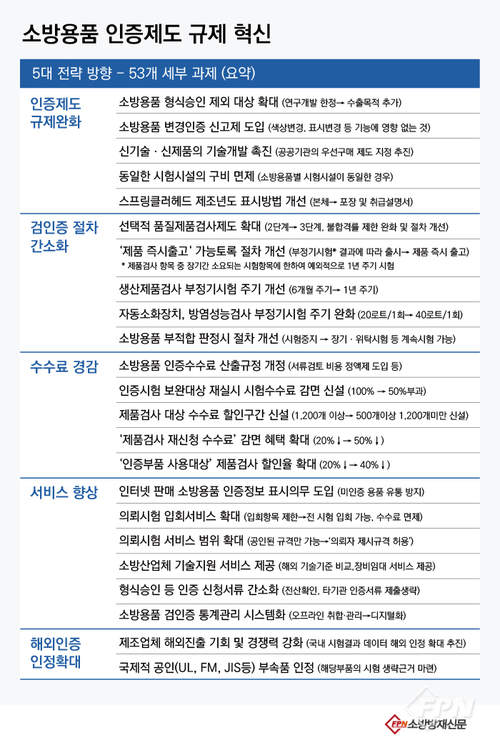“정말 괜찮은 걸까?”
지난 근무가 떠올랐다. 피로 얼룩진 손끝, 비명조차 채 사라지지 않은 그 자리. 처참하게 다쳐 숨진 환자, 숨이 끊긴 이를 붙잡고 흐느끼던 가족들.
나는 그 장면에서 온전히 벗어나 있었을까? 아니 여전히 그때의 두근거림이 심장 한구석에 맴돌았다. 살려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의 잔영처럼,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조용히 나를 물들이고 있었다.
몸은 움직였다. 습관처럼, 본능처럼. 차가운 손잡이를 잡고 시트에 몸을 맡길 때 가슴 한편에는 ‘다시 살아 있는 오늘’을 앞둔 묵직한 각오가 스며들었다. 붉은 차체는 아침 햇살을 받아 묵묵히 빛나고 있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결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땀과, 때로는 누군가의 피를 대가로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다시 소방차 곁으로 돌아왔다.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내기 위해. 내 작은 두려움과 씻기지 않는 아픔을 품은 채로.
비번의 하루는 짧았다.
두 아이는 현관 앞으로 달려 나와 내 다리를 끌어안았다. 피곤함에 지친 나를, 아내는 말없이 끌어안아 주었다. 어떤 모습일지라도 아이들에게 나는 여전히 든든한 영웅이자 버팀목이었다.
아내와 나눈 따뜻한 커피 한 잔. 아이들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우리는 함께 웃었다.
조금 뒤 아이들과 손을 잡고 동네를 걸었다. 놀이터 그네에 앉은 두 아이의 등을 밀어주고 숨바꼭질을 하며 해 질 녘을 지났다. 잠들기 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토닥토닥 등을 두드리며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아이들의 작은 숨결이 이불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하루를 위해 나는 다시 신발 끈을 조였다.
출동 벨은 아직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기꺼이 한 번 더.
다시 소방차에 올랐다. 붉은 차체 위로 부서지는 새벽빛 속, 오늘도 어제와 같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인천 계양소방서_ 김동석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