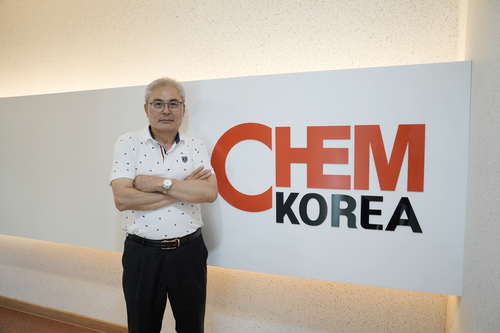점수체계의 기본 개념적으로 화재위험도는 ‘사고발생가능성’ X ‘사고 후 피해 규모’에 기반한다. 화재위험도의 경우 ‘화재발생가능성’ X ‘화재 시 피해 규모’로 정의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위험도는 Risk Matrix에 대입함으로써 위험도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Risk Matrix(그림 1)에서 나타나듯 붉은색의 A 영역은 노출빈도(사고발생가능성)와 피해심도(사고후피해규모)가 대부분 높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C, D 영역은 노출빈도와 피해심도가 낮아 위험도가 낮은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험도 산정결과는 Risk Matrix의 어느 한 영역에 위치하도록 도출돼야 한다. 이를 통해 위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고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①은 피해심도가 보통이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이며 ②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보통이지만 피해심도가 매우 높은 경우로서 위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isk Matrix에 표현하기 위한 점수산정은 매우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노출빈도와 피해심도 점수를 5단계로 하거나 혹은 100점 단위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수 단위는 신뢰도나 평가의 난이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면 된다. 만일 100점을 가장 높은 위험단계로 설정할 경우 위험도는 ‘화재위험도 = 화재 발생 가능성(0~100점)×화재 후 피해규모(0~100점)’로 산정된다.
위 식에서 가장 높은 위험도는 100점×100점=1만점이 되므로 위험도 결과는 0~1만점 사이에 해당할 거다.
다음으로는 산출된 위험도값에 따라 고위험과 중위험, 저위험 등과 같이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등급을 세분화하거나 혹은 단순하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위험도 값과 등급이 적절히 일치하도록 논리적인 근거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위험도는 위험경감계획을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년 내에 자산의 10% 이상 화재피해가 예상됨’과 같은 근거가 명시돼야 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그림2)으로 작성한 Risk Matrix의 예다. 국내 정서를 반영해 100점을 가장 낮은 위험으로 표현함으로써 위험도와 반대인 안전도 개념을 도입한 경우다. 안전도 등급을 점수에 따라 T(가장 우수), E(우수), N(적정) 등 세 등급으로 나눈 사례다.
다음 호에는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 후 피해규모'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여용주 국가화재평가원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