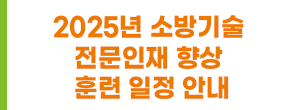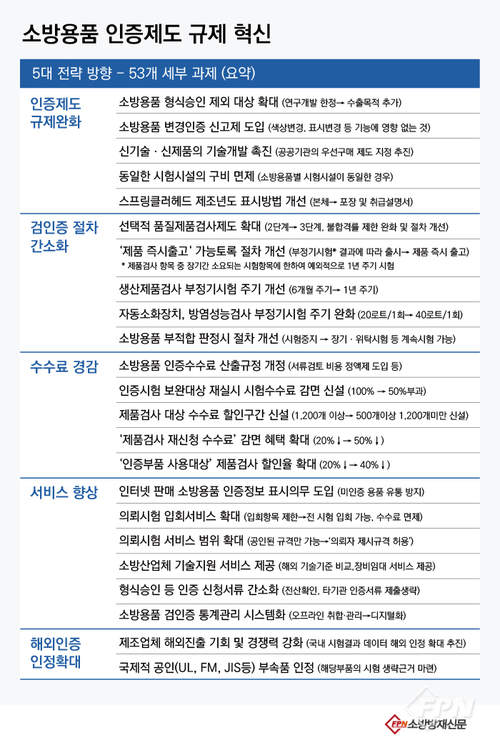|
지난 10일 밤에 발생한 국보 제1호 숭례문 화재는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왜적의 침입이라든가 6·25와 같은 전란 속에서도 600여 년을 아무 탈 없이 지켜온 문화재가 소실된 상황 앞에 국민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라는 탄식이 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 없었다. 마치 온 나라가 정신적 공황에 빠진 듯 하다. 그 와중에서 문화재 훼손을 염려한 나머지 화재 초기에 지나치게 신중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불길을 키워 결국 숭례문을 깡그리 태우게 됐다는 둥, 물을 제아무리 대량으로 살포하더라도 내부 구조물에까지 물이 침투하지 않는 목조 건축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둥, 뒤늦은 지적이 대두하기도 했다. 숭례문 화재와 1970년대 송광사 스님들의 소방훈련 누구나 알다시피 숭례문은 목조 기와집 형태의 건축물이다. 서까래 위에 개판(널빤지)과 적심(소나무)을 올린 뒤 다시 석회(강회다짐)와 흙(보토다짐)을 보강하고 나서 비로소 기와를 얹는 한옥의 구조상 바깥에서 제 아무리 물을 많이 뿌려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옛 건축물은 나무·돌·흙 등을 주재료로 사용한 목조건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목조건축은 자연친화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는 허점도 있다. 지난 1986년에 일어났던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 화재나 2005년에 발생해서 온 국민의 가슴을 까맣게 태웠던 강원 양양의 낙산사 화재가 대표적이다. 숭례문 화재로 참담해 있던 차에 문득 서랍 속에 넣어둔 사진엽서 한 장이 떠올랐다. 재작년에 송광사에 갔을 적에 성보박물관에서 산 옛 송광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엽서로 제작한 것들이다. 송광사의 오래 된 전각을 찍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속에서 가장 이색적인 사진은 스님들이 침계류 계곡에서 배를 젓는 장면과 절 마당에서 소방 훈련을 하는 장면이었다. 송광사는 국사를 열여섯명이나 배출한 승보사찰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승보인 송광사 스님들이 소방훈련을 하는 사진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 어렸을 적만 해도 소방장비가 변변찮았다. 동네에 불이 나면 십리 밖의 타 동네 사람들까지 양동이나 바가지를 들고 득달같이 달려와서 불을 끄곤 했다. 산불이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1970년대 당시 송광사 스님들의 소방훈련은 특별한 것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고가사다리, 살수차 등 너무나 훌륭한 소방장비가 많다. 그러나 이젠 어디에서도 자체 소방훈련을 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건 절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송광사에선 지금도 자체 소방훈련을 할까?! 우리나라 목조건축 대부분이 사찰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1970년대 당시 송광사 스님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도 자체 소방훈련을 할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불길과 싸우는 소방관도 시를 쓴다 혹 강신갑 시인을 아는가. 그는 대전 북부소방서에 근무하는 현직 소방관이다. 한남대를 졸업한 후 1986년부터 줄곧 소방직 공무원에 몸담아 왔다. 바쁜 소방관 생활 속에서 마음의 여백을 얻어 틈틈이 시작 활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1958년 충남 연기에서 출생한 강신갑은 월간 <시사문단>에서 주는 신인상을 받으면서 문단에 나온 이래 2004년 첫시집 <119와 어머니>를 비롯해 <119의 마음>(2005. 문경출판사), <마누라보이>(2007, 문경출판사) 등 세 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다. 2006년에는 '귀천'의 시인 고 천상병의 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귀천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신갑 시인이 쓴 '어느 소방관의 혼잣말'은 그런 필요성을 조용히 환기시켜준다. 물난리 불난리 바람난리 사고난리 소방관이 어디 그뿐인가. 생명 지킴이까지 목숨 걸어야 하지.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야. 백 점 받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듯 119가 있다 해도 스스로도 대비해야지. 물난리 불난리 바람난리 사고난리 소방관에겐 마귀나 다름없지. 가정불화까지도 과감히 물리쳐야 해. 그렇다고 그게 쉬운 건 아니야. 방재 너머 활짝 웃는 행복이 있듯 119와 함께 난리 없는 안전한 나라 되었으면 좋겠다. - 강신갑 시 '어느 소방관의 혼잣말' 전문 '어느 소방관의 혼잣말' 은 시집 <119와 어머니>에 실려 있는 시다. 시집은 생활 주변에서 얻어진 잔잔한 서정을 읊은 시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진화작업을 벌이는 소방관으로서 느끼는 비애를 형상화한 세 편의 시가 수줍은 듯 끼어있다. '119와 어머니', '119(fireman)', '어느 소방관의 혼잣말' 등이 그것이다. 119가 있다 해도 스스로도 대비해야지 시 '어느 소방관의 혼잣말'은 어렵지 않다. 현란한 수사로 가득한 관념이 없기 때문이다.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다. 몸으로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이 두루 드러나 있다. 그는 소방관의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들릴 듯 말 듯 나지막한 소리로 사람들에게 당부한다. "119가 있다 해도 / 스스로도 대비해야지"라고.
거기에 한 마디만 덧붙이자. "스스로도 대비"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사라져버린 숭례문을 '복원'하기 앞서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마음가짐부터 복원하는 게 급선무 아닐까.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책소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