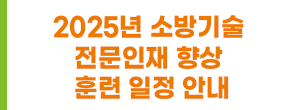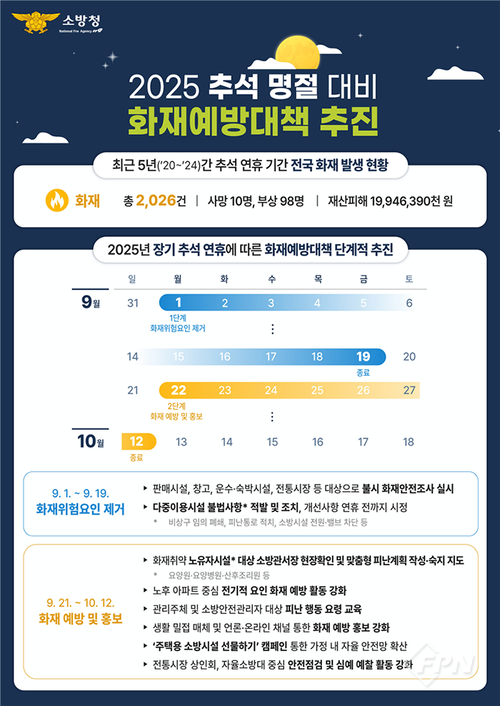리튬이온전지의 작동 원리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활물질의 산화ㆍ환원 반응에 있다. 리튬이온전지는 음극(Anode)과 양극(Cathode), 전해질(Electrolyte), 분리막(Separator) 등으로 구성된다.
양극과 음극을 오가며 전극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을 활물질(Active material), 두 전극 사이에서 이온 전달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 한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전자를 거르고 이온만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한다. 분리막 등의 파손으로 도선을 통해 흘러야 하는 전자가 전해질을 통해 흐르는 현상이 바로 열폭주다.
음극재는 구리박막에 음극활물질을 도포하고 양극재는 알루미늄박막에 합금계 양극활물질을 도포해 만든다. 음극활물질은 탄소, 인조흑연, 천연흑연이 사용된다. 초기 리튬이온전지는 음극재로 리튬금속을 양극재로 황화몰리브덴을 사용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충전 과정에서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음극재로 사용되던 금속 리튬은 충ㆍ방전이 계속됨에 따라 음극재 표면에 리튬금속이 석출돼 성장했고 결국엔 석출물이 분리막을 찢고 배터리의 내부를 단락시켜 열폭주를 유발한 것이다. 이로 인해 리튬이차전지가 장착된 휴대전화가 폭발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후 음극재로 쓰이던 리튬금속을 대체하려는 연구가 진행됐다. 대체재는 금속 리튬에 근접한 전위를 갖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하며 급속 충ㆍ방전에 견딜 수 있어야 했다. 무엇보다 충ㆍ방전에 대한 안전성이 좋아야 했다.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재료를 찾게 됐는데 바로 탄소다. 탄소는 수지나 피치로부터 얻어지는 난흑연화성 탄소와 천연흑연에서 얻어지는 흑연화성 탄소가 있다. 초기에는 저온 소성품인 소프트 카본을 사용했으나 하드 카본으로 옮겨갔고 나중에는 고밀도 카본(MCMB)이 사용됐다.
기존의 음극재로 리튬금속을 사용하던 전지를 리튬전지라 한다면 음극재를 리튬금속 대신에 흑연으로 대체한 전지는 리튬이온전지라고 한다. 리튬을 직접 음극재로 사용하지 않고 전해질에 녹여 리튬이온만 양극과 음극을 오가기 때문이다. 리튬이온전지는 금수성 물질이 아니기에 알려진 것과 달리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음극재에 리튬소스가 없이 리튬이온만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전지를 마치 그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여 스윙(Swing)전지라고 한다. 하지만 스윙전지도 문제점이 있었다. 과충전으로 인해 전압이 계속 올라가면 온도가 급상승해 열폭주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과충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탄소계 음극재의 또 다른 문제점은 낮은 에너지 밀도였다. 그래서 개발된 게 흑연 음극재다. 흑연음극재는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이 있다. 천연흑연은 제조가 쉬워 가격이 저렴하고 충전효율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고용량에 장점이 있지만 사용 중 팽창 문제로 수명이 짧았다.
인조흑연은 천연흑연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수명이 길고, 고출력에 유리하여 천연흑연보다 성능이 좋았다. 인조흑연은 코크스(Cokes)와 피치(Pitch)를 원료로 사용해 소성ㆍ탄화처리 과정을 거치고 다시 전기로에서 3천℃ 고온으로 가열하면서 제조하기 때문에 천연흑연보다 열팽창문제가 적다.
이후 리튬이온전지가 전기차에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고용량의 전지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실리콘 음극재다. 실리콘 음극재는 비스페놀에이(BPA)와 헥사메틸렌테트라민(HMT)을 혼합해 열처리를 통해 탄화시키고 다시 분말로 만들어 실란과 반응시켜 제조한다. 이렇게 만든 실리콘 음극재는 용량이 기존 음극재보다 3배 이상 높다.
양극활물질은 주로 니켈과 크롬, 망간을 사용하는 삼원계 계열의 활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리튬이온전지에서 양극과 음극을 오가며 직접 전기를 만들어내는 요소는 리튬이라는 활물질이다. 과거 리튬이온의 공급원은 음극재로 사용했던 리튬금속이었지만 잦은 화재로 인해 음극재가 탄소계로 변경된 이후 리튬은 마치 양극과 음극을 오가며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지로 바뀌었다.
리튬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방전 시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고 충전 시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며 일을 한다. 이때 전자는 도선을 통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해 전류가 흐른다. 이온의 이동 거리가 길수록 전지의 내부저항이 상승하기 때문에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전극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양극에 카본블랙과 같은 전자전도도가 높은 물질을 코팅하기도 한다.
김훈 리스크랩 연구소장(공학박사/기술사)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