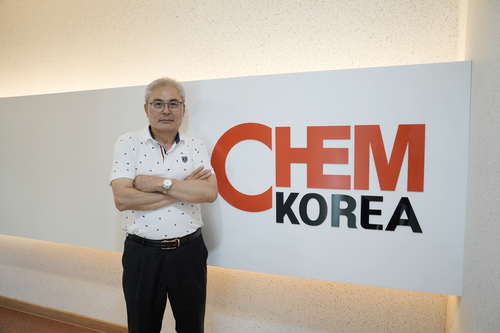[칼럼] 안타까운 최악 항공 참사, 신속한 수습과 완벽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탑승객 181명을 태우고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착륙을 시도하던 중 랜딩기어(Landing Gear 착륙장치)가 펴지지 않았다. 결국 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활주로 끝 단에 이를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 끝 방위각 시설을 들이받아 폭발했다. 소방이 실종자 수색과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승무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탑승객 179명이 모두 사망했다.
1980년대 이후 국내 항공기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10여 건에 달한다. 국내 항공기 사고 중 피해자가 가장 많은 건 1983년 9월 1일 옛 소련의 캄차카 근해 사할린 영공에서 대한항공 보잉747이 소련 격투기에 피격돼 탑승객 269명이 사망한 사고다.
이어 1997년 8월 6일 대한항공 보잉747 여객기가 괌 공항 착륙 중 야산에 추락해 225명이 사망했다. 가장 최근 발생한 국내 항공기 사고는 2013년 7월 7일 아시아나항공 B777-200 여객기 사고다. 2명이 사망하고 181명이 부상했다.
이번 사고는 세 번째로 인명 피해가 큰 최악의 항공기 참사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영상 등을 보면 착륙 전 해당 여객기의 오른쪽 엔진에서 폭발과 함께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1차 착륙을 시도하다 정상 착륙이 불가능해 다시 복행(Go Around)한 원인도 랜딩기어 미작동 때문인지, 엔진 이상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동체 착륙은 예외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사고 원인으로는 조류 충돌과 랜딩기어 오작동, 기체 결함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사고 직전 관제탑에선 사고 여객기에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를 경고했다. 이후 2분 뒤 기장이 조난신호인 ‘메이데이’를 요청했고 그로부터 4분 만에 충돌했다. 조류 충돌만으로 랜딩기어 조작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있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공항 관제탑과 교신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관제탑과 조종사 대처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점검할 부분이다. 동체 착륙을 위해선 통상 관제탑과 사전 교신하면서 연료를 최대한 버리고 활주로에 화염을 냉각시킬 물질을 도포한다. 이번엔 그런 사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항공기는 활주로 끝에 이르러서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다. 무안공항 활주로는 2.8㎞로 다른 공항(보통 3㎞)보다 짧다. 구조적인 문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안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4월 전임 사장이 사직한 이후 8개월째 공석이었다고 한다.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게 이번 사고와 관련성은 없는지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런 후진적인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천벽력의 참혹한 사고에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황망함과 항공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 심리를 달래고 어루만지기 위해서라도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뒤따라야 하고 완벽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런 재난 앞에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으고 정부도 행정 공백이 없도록 총력을 경주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항공 안전 선진국인 대한민국 명성에 누가 된 건 분명하다.
이를 만회하려면 정부는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의 전 운항 과정도 정밀 점검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든 관계 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고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참으로 다행이다. 항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해 구호와 보상에도 결단코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