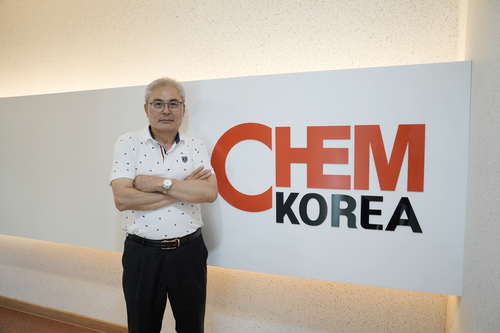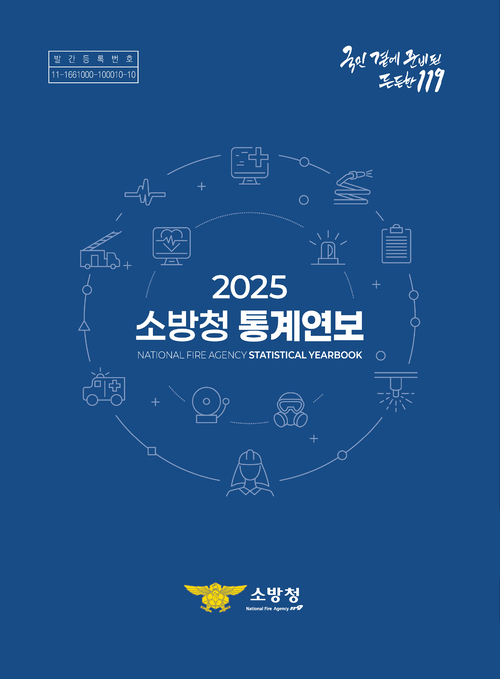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만 대당 차량 화재사고 건수는 내연차가 0.9대, 전기차가 0.93대로 전기차의 사고 비율이 약간 높았다. 하지만 사고 시 손해액은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1.9배 높았다. 이는 전기차가 한 번 불이 나면 쉽게 진화되지 않아 피해가 커진다는 걸 방증한다.
전기차 화재방지 대책은 사전과 사후로 나눌 수 있다. 사전대책은 배터리와 차량의 안전성을 높여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다. 사후대책은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말한다. 이번 칼럼에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다섯 가지 사후대책을 살펴보겠다.
첫째, 관리자의 철저한 안전교육이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워진 벤츠 EQE 차량에서 불이 났다. 관리자의 대응 미숙이 화재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관리자는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프리액션 밸브를 정지했다. 이 결과로 140여 대 차량이 전소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수다.
둘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권장이다.
대부분의 지하주차장은 난방이 되지 않는다. 이에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화재 시 소화수 방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NFPA13 에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방사 면적을 30% 증가하도록 규정한다. 국내엔 이런 기준이 없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권장하는 이유다.
셋째, 임시수조 설치다.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진압이 어렵다. FMDS 5-33 기준에 따르면 대량의 물로 냉각해 소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를 위한 임시수조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불연 내장재 사용이다.
2024년 9월 방영된 PD수첩을 보면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당시 천장에서 불비가 내린다. 화재에 취약한 주차장 배관 보온재로 확산한 것이다. 발포폴리에틸렌 재질의 보온재는 단열성이 뛰어나지만 화재엔 매우 약하다. 따라서 불에 강한 보온재 등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전용 CCTV 설치다.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전기차 화재를 인지하기 어렵다. 전기차 화재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방재실에서 전기차 주차구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용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홍승범 한국소방기술사회 화재보험기술위원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