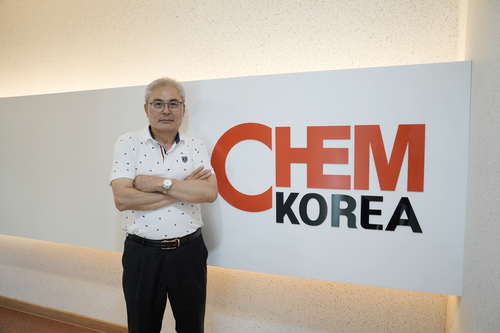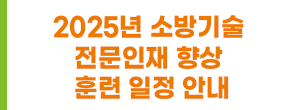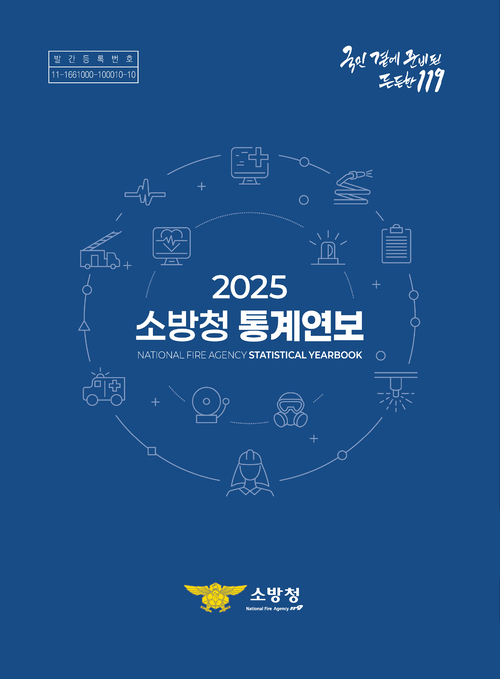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선진 소방기술의 수입국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근거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없었기에 추정과 가정을 통해 내용을 이해했다. 그 결과 기술자 개인의 해석과 기술적 판단으로 기준을 이해하게 됐다.
옥내소화전 동시 사용개수는 최초 일본 기준을 차용할 당시 최대 5개를 적용했다가 일본 기준이 실제 화원에 방수가 가능한 소화전 수로 바뀌면서 우리 역시 2개로 변경됐다.
스프링클러 기준개수도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과 영국은 화재위험을 고려해 상급, 중급, 경급으로 건축물의 사용용도(화재위험성)를 구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파트 층수, 용도 등을 고려해 10, 20, 30개로 정하고 있다. 업무용 건물은 10층 이하면 10개, 10층 이상이면 20개가 되고 건물 용도에 지하주차장의 기준개수도 변경된다.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제연설비엔 유입공기 배출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있지만 방연풍속은 만족해야 한다.
논리적으로나 공학적으로나 합리적이지 않지만 소방기술자들은 질문을 멈추고 기준에 순응하고 있다. 이의를 제기해도 변화가 없다는 경험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제도의 제정, 시행, 변경이 국가사무이기에 변화에 대한 융통성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적인 문제라면 그 자체를 바꿔야 한다.
개인적으로 기술기준, 시방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서 제정, 시행, 변경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질문과 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설계, 시공, 감리, 유지ㆍ관리하는 소방시설물들은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한 예로 미국에선 제연설비의 제어반(감시 및 동력)은 소방대원이 건축물로 진입하는 주 출입구 인근에 설치해야 한다.
종합방재실에 화재수신기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것과는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제연설비가 소화활동 설비라면 소화활동을 하는 주체인 소방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화재안전기준의 많은 내용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소방시설물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지와 누가 이 시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 어떤 성능을 가진 시설이 필요한지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해야 한다.
전기차 대비용 질식소화포(방화덮개)는 어떤 목적으로 누가 사용하고 설치 장소는 어디여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에 소방기술자들이 답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 기준을 도입하는 시기를 지나 새로운 원천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기준을 수출하는 국가가 됐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의문과 질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소방기술자들이 돼야 한다.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