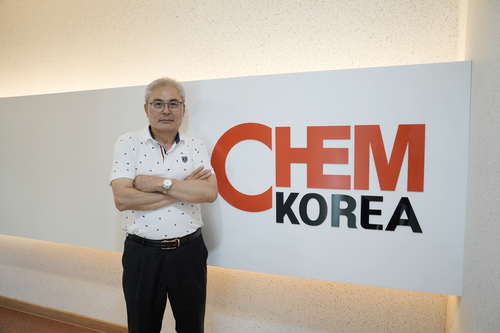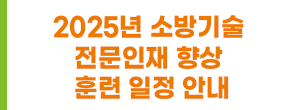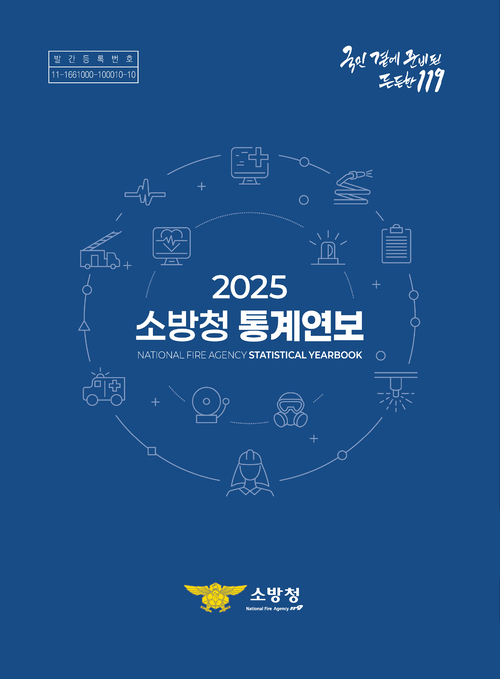|
소방기술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 최근에는 첨단 IT기술과의 융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완벽한 화재안전을 확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기술발전으로 화재발생 빈도를 낮추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최근 화재사고는 과거에 비해 규모가 크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사회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다행히 규제 위주의 소방정책도 기술개발과 연구 투자로 많이 바뀌고 있다. 일률적 기준의 적용보다 더욱 세밀한 부분을 고려하고자 애쓰는 듯 하다.
화재로부터 위험을 낮추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매우 다양한 변수의 관리와 제어가 필요하다. 소방시설은 물론 화재 예방을 위한 활동과 대응전략도 요구된다.
소방기술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재경보설비와 소화설비는 그런 대응요소 중 최소한의 방책일 뿐이다. 동일한 용도의 건물 또는 공간도 가연물과 점화원의 양, 관리상태, 화재초기 대응조직과 숙련도, 인근 공공소방대의 소방력과 물리적 거리, 건축물의 구조와 크기 또는 방화성능 그리고 크게는 구성원의 인식과 마인드도 화재안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다.
결론적으로 건물(공간)의 화재안전도(이하 화재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화재위험도 결과는 개별 건물과 사업장에선 더욱 세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는 기반이 된다. 크게는 국가 소방정책의 일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분야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위험평가기법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을 낮추고 있다. 이를 통해 사고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다. 소방분야도 이젠 화재위험평가 기술을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 최근 입법 예고된 화재예방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는 모습이다. 소방엔지니어로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화재위험평가는 올바른 평가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화재위험평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화재위험평가는 평가대상 건물 또는 공간의 화재위험도를 정량적인 값으로 산출하기 위한 기법이다. 위험이란 ‘사고 발생 가능성’과 ‘발생 후 피해 규모’의 두 가지 요소에 비례한다. 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거나 ‘사고 후 피해 규모’를 낮추면 된다.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적용 난이도와 투자금액의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소방시설은 ‘사고 후 피해 규모’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고 화재예방활동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더 많은 영향을 준다.
다양한 화재위험평가 기법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위험도’에 근거한다. 그중 미국의 Thomas F.Barry, P.E가 소개한 ‘Risk Informed, Performance based Industrial Fire Protection’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은 화재 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이벤트를 나타낸 것이다. 1, 2, 3단계는 화재초기 성장단계며 4단계부터 화재가 상당히 성장하면서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이다. 4단계를 지나 공간 전체로 연소가 확대되는 5단계에 도달하고 5단계를 지나면서 다른 공간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6단계를 향하게 된다.
이를 사업장의 화재안전관리와 연계하면 아래처럼 정의할 수 있다.
1단계 – 화재예방활동 2단계 – 화재감지 및 경보 대응수준 3단계 – 화재초기대응 수준 4단계 – 소화설비 대응 수준 5단계 – 공공소방대 대응 수준 6단계 – 건축물의 방화 대응 수준
이를 통해 위험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건물 또는 공간의 단계별 점수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은 체크리스트 기법과 공학적 분석 기법, 통계와 확률 기법 등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건물 전체의 화재위험도를 산출할 건지 아니면 공간을 하나하나 쪼개 산출할 건지에 따라 가장 적합한 기법을 적용하게 된다. 다음 편에서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 논해보겠다.
여용주 국가화재평가원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