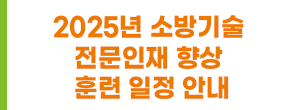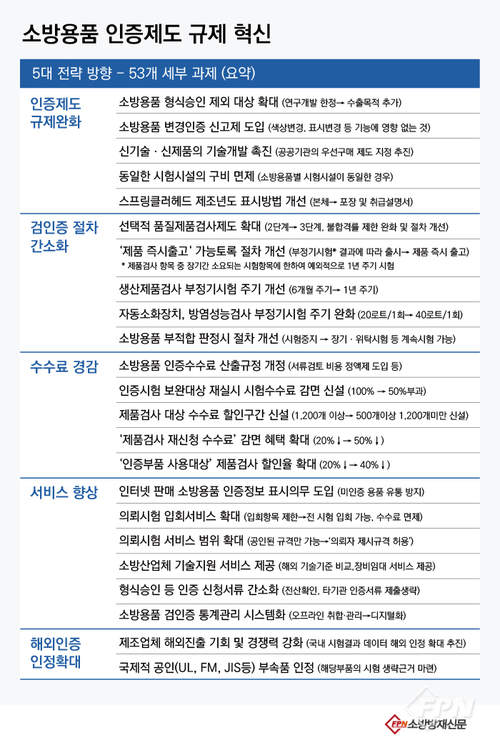|
밀린 숙제라도 하듯 침대에 누워 낮잠을 청하던 황민철 소방관.
억지로 눈을 감고 있지만 쉬 잠이 오지 않아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려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든다. 얼마나 지났을까. 머리맡에 둔 휴대전화가 황 소방관을 모질게 흔들어 깨운다.
“민철아! 너 괜찮냐? 나는 어제오늘 그 벨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데… 휴~ ” “네, 사실 저도 조금 힘드네요.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전화를 끊고 다시금 잠을 청하지만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어제의 현장이 이미 황 소방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기분 탓일까. 어스름 창문 밖으로 전해지는 버스 엔진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마치 어제의 현장처럼. 그렇게 황 소방관은 자신도 모르게 어제의 기억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2021년 6월 9일. 광주 도심 한복판에 철거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수구조대에는 비번 근무자 전원을 소집하는 비상근무 명령이 떨어졌고 비번 날이었던 황 소방관도 구조버스에 올라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으로 출동하는 차량에서는 도착 직전까지 쉴 새 없이 무전소리가 울려 퍼졌다. 황 소방관은 무전 음성만으로도 현장이 얼마나 다급한지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건축물 붕괴 잔해가 도로를 점령했고 그 밑에는 승객을 태우고 있던 노란색 시내버스가 종잇장처럼 찌그러져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시내버스 주 연료인 CNG 가스까지 새어 나왔다.
“민철아, 버스 위로 올라가서 CNG 가스 잠가야겠다. 저거 터지면 큰일 난다” “네, 팀장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지시에 망설임 없이 CNG 가스가 부착된 버스 천장으로 올라섰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커지는 가스 소리에 황 소방관의 심장도 덩달아 크게 뛰었다. 하지만 사고 충격으로 이미 CNG 가스 밸브는 떨어져 나간 상태로 현장에서 가스를 차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황 소방관은 CNG 가스 누출 상태를 지휘부에 전달한 뒤 복장을 가다듬고 버스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현장은 가장 먼저 도착한 관할 구조대원들이 버스 진출입로를 확보해 앞쪽에 있던 생존자들을 구한 상태였고 피해가 컸던 시내버스 뒤편으로 구조가 남은 상황이었다.
황 소방관은 동료 구조대원과 함께 내부진입을 시도했다. 허리조차 펼 수 없는 좁은 내부와 진입을 막는 각종 장애물, 그리고 계속해서 새어 나오는 CNG 가스까지… 짧은 거리였지만 버스 뒤편까지의 이동은 녹록지 않았다.
기적이 있길 바랐지만 황 소방관은 곧 참혹한 현장에 맞닥뜨린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자신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승객들을 온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에 박혔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폐쇄된 공간 속에 두려움을 이겨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렇게 동료 구조대원과 함께 한 분, 한 분 구조를 이어가던 중 저 멀리 보이는 마지막 승객을 향해 다가설 때였다. 어디선가 울린 휴대전화 벨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다. 벨소리를 따라 내부로 진입해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바라보자 화면 위로 ‘엄마’라는 글자가 황 소방관의 눈에 들어왔다.
의연하게 구조작업을 하던 황 소방관도 ‘엄마’라는 단어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차마 받을 수 없었던 휴대전화를 놔둔 채 벨소리를 들으며 동료 구조대원과 함께 마지막 승객을 구조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어 마지막 승객 옆에 가만히 올려놓은 뒤 가장 마지막으로 버스에서 빠져나왔다.
어느새 현장은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소방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이 현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리고 황 소방관의 방화복은 선홍빛 핏자국과 유리 파편,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장갑을 겹쳐 방화복을 털어내며 동료 대원들과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말을 주고받은 뒤 시내버스를 마주하는 돌 턱에 걸터앉은 황 소방관. 초여름 날씨에 어울리지 않은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그의 뺨을 닿자 온기가 깃든 냄새가 났다.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황 소방관은 그날의 바람 냄새 그리고 버스 안에서 울려 퍼졌던 휴대전화 벨소리를 잊지 못한다. 마치 그날을 잊지 말라는 듯…
광주소방학교_ 이태영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희로애락 119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