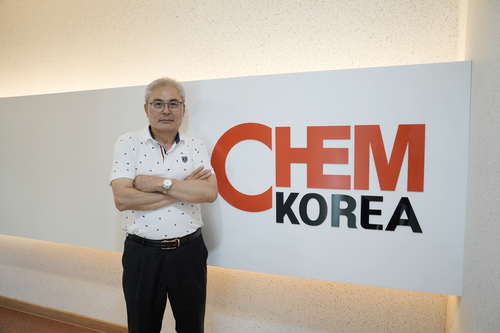|
[⑩ 선상의 리튬이온배터리 선적 방법(LITHIUM-ION BATTERY STOWAGE ON SHIP)]
ㆍ컨테이너 사이에서의 화재 확산(Fire Propagation)
- 화재 전파는 여러 컨테이너 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온도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운반하는 컨테이너의 블록 적재 또는 위험물이나 인화/가연성 물질(flammable materials)을 운반하는 다른 컨테이너와의 근접을 피해야 합니다.
ㆍ컨테이너 선적 위치(Container Stowage Location)
- 리튬이온배터리 컨테이너를 스토윙(본선의 선창 내에 하나씩 손해를 입지 않도록 장치하기위해 싣는 작업; stowing)할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적절하고 충분한 위험 평가를 통해 ‘다른 중요ㆍ위험화물(DG)’로부터 분리돼야 합니다.
ㆍ선박 내 고정이나 휴대용 소방장비의 사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ㆍ컨테이너는 소방 절차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위치에 놓여야 합니다.
장비의 운용 높이ㆍ범위 제한, 소방장비 작동 시도 인원의 안전한 접근ㆍ배치, 경계 냉각과 같은 격발 대책 적용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리튬이온배터리를 포함한 컨테이너는 비상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소방대책이 시행될 수 있는 위치에 보관되는 걸 권장합니다.
|
리튬이온배터리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하중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컨테이너선에 적절하게 선적할 때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 화재 확산에 대비해 해당 컨테이너 화물 바로 옆에 사용 가능한 소방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를 주차하면 안 된다는 논리의 핵심은 소방차량이나 소방설비 등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고 반밀폐 상태를 유지해 너무나 이른 시간 내에 온도가 상승하고 연기 등이 확산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선상에서도 너무나 치명적일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비는 소화설비 등이 직접 분사되고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통제범위 안에 두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도 관련자 모두가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으면 합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규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⑪ 리튬이온배터리 화재(LITHIUM-ION BATTERY FIRES)]
ㆍ화재 삼각형에서 화재 사면체로의 진화
- 화재의 자체 지속과 관련된 반응 과정은 ‘제한되지 않은 화학적 연쇄반응(uninhibite chemical chain reaction)’이라고 합니다. 이는 화재가 연소반응에서 계속 열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화재 사면체에 포함됐습니다. 화재를 소화하려면 제한되지 않은 화학적 연쇄반응을 차단해야 합니다.
- 리튬이온배터리 셀 내에서의 화재는 금속 화재(metal fire)가 아니라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화학분해반응(Chemical Decomposition Reaction)입니다. 방출된 열로 인해 셀 내용물의 일부가 분해(decompose)되고 인접한 셀에서도 분해 반응(decomposition reaction)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열폭주(Thermal Runaway)’라고 불리며 화재를 촉발시킵니다.
|
중요(IMPORTANT): 일단 화재가 진압됐다 해도 결코 열 확산(Thermal Propagation)이 멈춘 건 아니며 해당 사고의 위험성(Hazard)은 오히려 폭발(Explosion)로 넘어간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화재진압을 위해 에어로졸(aerosols – (역주) 국내는 가스계와 합쳐서 사용됨), 분말 소화약제(dry chemicals), 기체상 소화약제(gaseous suppression – (역주) 청정, 할로겐 등), 질식소화 덮개(fire blanket)와 같은 소화약제가 사용됐을 때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ㆍ리튬이온배터리 화재(Lithium-Ion Battery Fires)에서 식별된 위험성(Hazards)
-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인해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들(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NFPA, 2020)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화재와 폭발
ㆍ화학적 우려(Chemical Concerns)
ㆍ환경적 우려(Environmental Concerns)
ㆍ전기적 우려(Electrical Concerns)
ㆍ남아 있는 에너지로 인한 위험(Stranded Energy)
ㆍ물리적 우려(Physical Concerns)
ㆍ구조적(붕괴) 우려(Structural Concerns)(특히 리튬이온배터리에 의해 발생한 화재ㆍ폭발 후)
|
▲ [그림 1]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예시(출처 Free)
|
화재 중 발생하는 기체(가스)(DNV GL AS Maritime, Joint Development, 2019)는 다음과 같을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CO)
- 수소(Hydrogen; H)
-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NO2)
-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HCL)
- 플루오린화수소(불화수소; Hydrogen Fluoride; HF)
-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HCN)
- 벤젠(Benzene; C6-H6)
- 톨루엔(Toluene; C7-H8)
- 메탄(Methane; CH4)
|
- 열폭주의 첫 번째 뚜렷한 징후는 종종 수증기(steam)와 혼동되는 백색 증기(white vapour)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화/가연성(flammable)과 독성(toxic)이 있습니다. 아래는 폭발 중 발생하는 무제한 증기운폭발(UVCE; Unconfined Vapour Cloud Explosion) 사례의 예시((역주) 2019년 APS 사고 사례)입니다. 용매의 작은 물방울들(droplets)이 폭발(폭연; deflagration)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 [그림 2] 2019년 APS 사고 당시의 ESS 컨테이너 UVCE 사례의 이미지(출처 Hill, Davion / DNV GL 2020)
|
- 만약 증기(vapour)에 불이 붙지 않는다면 높은 독성(high toxicity)과 관련된 완전히 다른 위험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증기운 폭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출처 Christensen, et al., 2021)
·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s)에서의 화재 예방(Fire Protection), 화재 감지(Fire Detection), 화재진압(Fire Extinction)을 위한 규정들
- 화재 감지(탐지)(Fire detection): 현재 선택한 화물칸 위치로부터 공기 흡입(air aspiration)에 의한 연기 탐지(smoke detection) 기반의 화재 감지 설비(fire detection systems)는 화재 발생을 적절하게 식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입증됐습니다. 따라서 화재 전파 위험을 평가하거나 적절한 화재 억제 장벽을 정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 화재 억제(화재 고립; Fire containment): 적용 가능한 규정은 초대형 선박 설계에 있어 특별한 고려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실질적으로 선체 구조를 보호하고 인접 구획으로의 화재 확산을 피하는 방화벽(thermal barrier; 화재 구획)이 없습니다.
- 화재진압(Fire Suppression): 대형 컨테이너선의 화재진압 설비(Fire Suppression Systems)는 특히 전파가 확대되는 경우 화재에 대응하는데 충분하지 않음이 입증됐습니다. 화물칸 내에서의 고정 CO2 침수와 위쪽으로 물을 분사하는 이동식 물 분사 장치의 조합은 화재를 소화하고 소화 작업 중 생명과 선박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보고됐습니다.
- 결과적으로 컨테이너선의 화재 보호와 화재 탐지, 화재 억제 규정은 선박의 크기 증가, 단일 선박에 실려지는 컨테이너 수의 큰 증가와는 동일한 속도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이 IMO/Cargo Safe 연구는 이미 컨테이너선의 화재 대응이 어려웠음을 확인하며 이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포함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
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대한 분석내용이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화재를 멈추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는 보이는 현상 자체를 떠나 ‘발열분해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진압 시 무엇보다도 연쇄적인 반응을 끊어야 하므로 단순히 산소를 제거하고 온도를 낮추는 차원으로 쉽게 진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폭주를 일반적인 화재와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는 국내의 진압 상황이 옳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화재) 시 발생하는 VCE(배출 연소성 유화물)의 존재는 기존의 화재 연기와는 다릅니다.
화재 종료는 더 위험성이 높은 폭발이라는 결과를 낳으며 소화약제의 존재가 폭발의 위험성을 보다 높여주는(산소를 밀어내고 적절한 폭발범위의 형성을 도울 경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현장에 있는 모든 대원이 인지해야만 합니다.
또 열폭주 시 발생하는 VCE인 흰색 증기들은 매우 유독성이 큰 물질이 많으므로 화재뿐 아니라 독성에 대한 보호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열과 독성에 대한 두 가지 위험을 완전히 방호할 수 있는 개인보호장비는 없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선의 크기는 커졌지만 소방시설 등 화재에 대비한 시설은 동일한 속도로 발전하지 않았고 현재 상황은 리튬이온배터리를 진압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대비가 당연히 돼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선박 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시 선원 등 탑승 인원 모두가 망망대해에서 언제든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빠르게 개선책이 나와야 함을 알려 줍니다.
|
[⑪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이어서)]
- 화재 감지: 컨테이너선 화물실 내에는 일반적으로 연기 추출ㆍ화재 감지 설비(smoke extraction and detector systems)가 장착돼 화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보고된 바로는 감지 방법 중 가장 느리며 제한적으로 사용됨).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적외선 감지기(IR Detector) 또는 연기, 열을 함께 감지하는 결합형 연기-열 감지기(combined smoke-heat detectors)와 같은 전통적인 열 감지기(heat detectors)를 사용해 감지될 수도 있습니다(보고된 바로는 가장 빠르며 더 유용하다고 여겨짐).
연기로 가득 찬 화물실에서 특정 컨테이너를 찾는 작업은 선원에게 매우 위험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는 선박이나 해안 안전 관리 시스템에 연결되는 센서가 포함됩니다. 열화상카메라(Thermal imaging cameras)도 갑판 위ㆍ아래의 온도상승을 감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비상 대응 절차(Emergency Response Procedures): 조직은 적절한 평가를 통해 위험 수준을 결정하고 견고한 응답과 배터리 처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상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리튬이온배터리 제조업체는 운송 중인 리튬이온배터리 화물 유형에 적합한 소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IMDG 9종 유해물질(위험화물, IMDG Class 9 dangerous goods)에 대한 IMO 비상 일정(EmS; Emergency Schedules)을 반드시 따르거나 리튬이온배터리 화물 예약 이해 관계자로부터 수신한 정보에 따라 유해물질(위험화물; DG)을 운반하는 선박의 비상대응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화재 진압: 선택한 소화 방법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를 진압하고 배터리 온도상승을 통제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충분히 냉각되지 않으면 열폭주 반응이 지속돼 배터리가 다시 발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진압설비(Lithium-Ion Battery fire suppression systems)가 이겨내야 할 주요한 과제입니다.
초기 셀에서 열 전파(heat propagation)가 통제되지 않으면 인접한 셀도 열폭주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열 전파를 방지하려면 대형 배터리 팩(large battery pack)의 셀을 냉각시키는 게 단일 셀의 화재를 소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대응 전략은 불타고 있는 셀을 소화하는 것뿐 아니라 인접한 셀을 냉각시키는 걸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화제를 사용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를 억제하는 방법은 아래에 설명돼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배터리의 생산자와 제조업체, 발송업체, 생산자로부터 관련 조언을 구하는 게 권장됩니다.
· 물(수계 소화약제; Water): 물 기반 소화약제(Water-based extinguishants)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를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높은 열용량과 증발열을 갖는 물은 우수한 냉각 매질이며 열 파열 전파를 주변 배터리로부터 완화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물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화재를 진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 분무(Water Spray)는 특히 갑판(deck)에 적합한 위치에서 컨테이너 화재진압과 냉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폼(foam; 포):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효용성을 조사하고 있는 물질은 ‘폼(foam)’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폼이 컨테이너와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셀들을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단일 20ft 또는 40ft 컨테이너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 분말(Powder): 파우더 소화제는 화재 반응을 화학적으로 중단시키면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냉각을 제공하지 않으며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이산화탄소(CO2): 이산화탄소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있어 이상적인 소화약제는 아닙니다. 이산화탄소의 냉각 능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소의 가용성을 매우 감소시켜 화재 과정을 느리게 하고 반응 시간을 줄입니다. 직접 관련된 열 흐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여기선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감지(탐지)와 소화약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재 감지에 있어 기존 전통적 화재 감지 설비의 효용성은 낮다는 점을 이미 여러 번 강조했던 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가 개선책으로 적외선 감지기(IR Detector), 연기와 열을 함께 감지하는 결합형 연기-열 감지기(combined smoke-heat detectors)를 제안합니다. 최근 NFPA 855 개정판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열화상카메라를 새로운 기술로 제안하는데 여기엔 최신 AI 기술이 추가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필자가 지속해서 강조한 대로 화재가 아닌 HazMat(유해물질/위험화물(Dangerous Goods; DG) 사고로 보면서 HazMat에 입각한 비상대응절차(매뉴얼)를 구비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복합적인 위험성(화재/폭발ㆍ독성ㆍ누출)을 가진 리튬이온배터리 사고에 대한 국제적 수준에 맞는 매뉴얼 구비가 매우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우리나라엔 HazMat/DG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진압의 관점에서 충분한 냉각이 무엇보다 우선 고려돼야 함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근원이 되는 셀보다는 팩 전체의 냉각과 동시에 인접한 배터리 팩 등으로 화재 확산을 막는 걸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간 <119플러스> 글들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소화약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도 분석이 미흡해 보입니다. 리튬이온배터리 제조사에서는 열폭주를 고려해 배터리 팩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약제가 배터리 팩이나 셀 내부로 들어가는 양이 수많은 이유로 희박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앞서 언급한 추가 화재나 열폭주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냉각 효과가 크면서도 오랜 시간 다량을 구비할 수 있는 물 분무에 의한 소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인 소화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폼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연구 중이라는 부분은 보다 세부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ESS의 전반적인 설계ㆍ소화방식, 열폭주 시 발생하는 독성의 증기, 기체 등 배출과 같이 개선해야 할 요소가 너무나 많으므로 향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⑫ 미래(Future)]
· 리튬이온배터리의 운송과 관련된 사고 기록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급망의 개선이 긴급히 요구됩니다. 여기엔 식별(identification)과 분석(analysis), 근본 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 위험성 효과(effects of the hazards), 모든 공급망 이해 관계자 지식 향상이 포함됩니다.
· 앞으로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업자와 공급망 이해 관계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컨테이너 내부의 기존ㆍ운영 중인 리튬이온배터리 포장 설비(Lithium-Ion Battery packaged systems)의 열폭주 확산(thermal runaway cascading), 배기/환기(ventilation), 진압(suppression) 취약점 다루기
- 업계 표준, 운송 규정, 코드 업데이트를 통한 리튬이온배터리와 미래 ESS의 열폭주 다루기
- 리튬이온배터리의 성능기반표준(performance-based standards)을 개발해 위험한 효과(결과)가 포장(패키지) 내에 포함되도록 원칙 설정
- 열폭주 관리를 위한 환기ㆍ억제(ventilation and extinguishing) 또는 냉각 설비(cooling systems) 개발(특히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 열폭주 중 배터리 셀과 모듈의 열폭주 확산 또는 전파를 늦추거나 중단시키는 리튬이온배터리, BESS 설계 개발
- 독성ㆍ인화/가연성 가스(기체)(toxic and flammable gases)와 화재의 위험성을 고려한 교육, 훈련, 비상대응절차 개발, 화재 후 컨테이너 진입 방법
- 공장 심사(factory audit)ㆍ공급망 고객 절차와 관련된 투명성 도입
- 리튬이온배터리 운송 물품 확인(screening), 검사(inspection), 포장 조사(vanning survey) 도입
- 항공 운송과 동일한 포장 지침을 해상 운송에 적용
- 새로운 ‘에어로졸 기술(aerosol techniques)’과 같은 새로운 화재진압(소화) 기술 연구와 고려
- 특정 리튬이온배터리의 ‘오프가스(Off-Gas) 배출’ 탐지 설비(detection systems)의 조기 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s) 도입
|
마지막으로 향후 개선ㆍ중점적으로 연구돼야 할 과제를 요약 정리해 줬습니다. 이는 앞으로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와야 할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향후 안전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분석한 사례를 본 적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힌트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문제점의 해결책을 요약한 내용 하나하나가 개인적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믿습니다.
이 글에서 오프가스와 관련해 탐지설비와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은 안전이 확실하게 개선된 전고체배터리가 나오기 전인 앞으로의 10년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로 예상합니다. 최근 카카오 사태 이후 해당 설비에도 오프가스를 탐지하기 위한 탐지설비가 설치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반적으로 적용해 조기에 열폭주를 알아내기 위한 두 가지 이상의 수단을 중첩해 갖추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여기서의 모든 개선과제가 국내에서도 개선해야 할 핵심 문제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 빠르게 개선책이 나오고 소방관과 함께 관련된 모든 분, 특히 선박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운송에 있어 큰 사고 없이 조속히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기 용인소방서_ 김흥환 : squalkk@naver.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