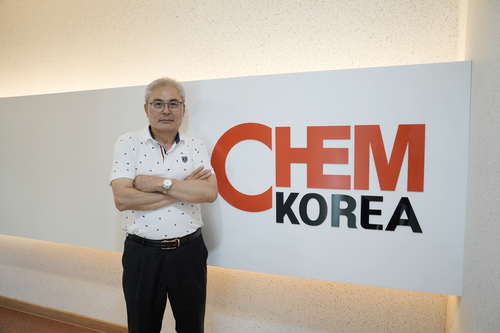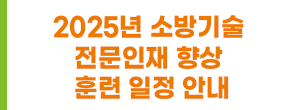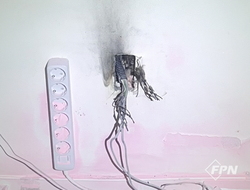바지선에서의 첫날 바지선 연락관과 안전 담당관 임무를 처음 수행하는 날이라 동선과 장비를 먼저 파악했다. 사실 파악할만한 공간도 아니었지만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밤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막아 줄 수 있는 장소는 없을까 기대도 했지만 곧 포기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런 협의 없이 바지선에 올라가라 한 지휘부도 대책이 없었지만 나도 융통성이 없었다. 바지선에 상주할 여건이 안 돼 해경 경비함에서 대기하다 구조대원들이 바지선으로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라 해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야 생각해본다.
바지선과 협의가 없었으니 당연히 숙식은 해결이 안 됐다. 이후 언딘 리베로호 바지선으로 교체됐을 때도 상황은 같았다. 결국 한 달 반을 야전침대와 침낭으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었다.
오전 2시 24분께 바지선으로 구조대원들이 도착했고 그 인원 중에는 소방 잠수사도 네 명이 있었다. 하지만 정조 시간인데도 조류가 너무 강해서 대기만 하고 다시 경비함으로 돌아가야 했다.
구조 작업을 할 땐 해경 경비함에서 구조대원들이 이동했다. 북적이던 바지선에서 그들이 빠져나가면 바지선 밑에 수백 명의 실종자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새벽에 차디찬 바닷바람이 온몸을 때리는데 너무 추웠다.
쪼그려 앉아 배낭에서 꺼낸 침낭을 덮고 구조대원들이 바지선으로 다시 올 때까지 최대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했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바지선 잠수사가 준 사발면뿐이었다.
하루에 딱 네 번 정조 시간에 구조 작업을 했다. 정조 시간은 여섯 시간마다 돌아온다. 그 시간 동안 소방에선 나 혼자 바지선에 남겨졌다.
인양 작업 변경 수중에서 실종자들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의 부력을 이용해 상승시키는 작업이 불안했는지 인양 작업이 변경됐다. 금호수중의 민간 잠수사 인원이 많지 않아 표면 공급 잠수 경험이 있던 해경 구조대원과 같이 잠수했다.
표면 공급 잠수 장비를 사용하는 잠수사들이 실종자를 찾아 감독관에게 통신하면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소방, 해경 대원들이 25m에서 실종자를 인계받고 상승하는 작업으로 전환됐다. 세월호 선실 유리창을 깰 수 있는 장비들을 소방에 요청해 현관문 파괴기 등 기타 장비를 전달해 준 시기기도 하다.
소방에서 더는 더블 탱크를 착용할 이유가 없어졌다. 25m 하강 라인으로 내려가 실종자들을 인계받고 상승하면 10분이 채 넘지 않는다. 하지만 바닷속에서의 활동이라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했다.
각 시도에서 수난 구조에 능력 있는 직원들이 왔지만 경비함에 탑승할 수 있는 소방의 인원이 제한적이라 하루 네 번의 인양 작업 중 두 번 참여할 수 있었다. 시도 직원들은 이후 교대가 이뤄졌지만 중앙119구조본부 직원들은 교대 없이 임무에 투입됐다.
언딘 리베로호 4월 23일 저녁에 언딘 리베로호 바지선이 현장에 도착했다. 금호수중의 낡고 작은 바지선에 있다가 옮겨탔다. 이제 막 건조된 바지선이었다. 페인트 냄새조차 가시지 않았고 화장실의 문을 비롯한 모든 문의 보호 비닐도 떼어내지 않은 상태였다.
이 바지선 투입에 관해선 말이 많았지만 구조 작업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땐 잠수 작업에 특화된 바지선이었다. 일단 바지선이 높지 않아 잠수 대원들의 입ㆍ퇴수가 굉장히 쉬웠다. 또 크레인과 다른 장비의 공간 배치가 잘 돼 있어 컨테이너를 바지선 위에 쉽고 활용성 있게 놓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잠수대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챔버가 있었다. 리베로호가 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간 잠수사가 감압병에 걸렸었는데 챔버가 있어 회복할 수 있었다. 민간 잠수대원들과 바지선 운영자들을 위한 숙소도 잘 준비돼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내가 머물 곳은 없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바지선이 작업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설치한 네 개의 앵커용 라인은 맹골수도보다 강한 조류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굵고 강하게 만들어졌다.
그중에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건 GDPS1)를 이용해 바지선을 세월호 위쪽으로 변함없이 정박시켜 주는 시스템이다. [사진 3]에서 큰 직사각형이 바지선이고 각 모서리에서 나가는 선이 앵커 라인이다.
[사진 3]을 바탕으로 상황을 구현시킨 게 [사진 4]다. 리베로호와 동시에 민간 잠수대원, 바지선ㆍ챔버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도 보강됐다. 그래서 실종자 인양 작업은 표면 공급 잠수장비를 이용하는 민간 잠수사들이 세월호 내부로 들어가 수색하고 소방, 해경에게 인계하는 거로 다시 바뀌었다.
다이빙 벨 모든 작업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밖에서의 언론 보도와 여론은 그렇지 않았다. “해경과 언딘의 유착이 있다. 해경이 구조 작업을 잘못하고 있다. 모든 것은 민간 잠수사들이 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가 흘러나왔다.
해경의 유착과 관련해선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라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곡된 보도가 너무 많았다.
그중 하나가 ‘다이빙 벨’이다. “다이빙 벨을 사용하면 보다 많은 실종자를 빨리 찾고 인양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다. 이 다이빙 벨 투입도 검토됐으나 맹골수도의 조류와 짧은 정조 시간 때문에 오히려 투입되면 구조 작업에 이점이 없어 사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언론과 여론에 밀려 해경은 다이빙 벨 투입을 허가해 줬다. 다이빙 벨 바지선이 현장에 도착해 정박하려고 할 때 조류가 아주 강했다. 다이빙 벨이 있는 바지선은 리베로호보다 훨씬 작았다. 그렇다 보니 정박하기 쉽지 않아 조류에 밀려가려는 걸 해경 경비함이 옆에서 도와줬는데 결국 실패하고 철수했다.
그랬더니 다음날 “해경이 다이빙 벨 투입을 못 하게 경비함으로 밀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소방관인 나도 허탈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해경은 오죽했을까. 철수한 다이빙 벨 바지선은 다음날 다시 현장에 투입된다.
1) GDPS는 세계 최초의 정지 해양 위성 자료처리 시스템으로 개발돼 자료의 처리, 디스플레이, 검증, 분석 등의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을 보유한 해양환경 분석 프로그램이다(출처 kosc.kiost.ac.kr/index.nm).
독자들과 수난구조에 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 사건ㆍ사례 위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한다. 만일 수난구조 방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e-mail : sdvteam@naver.com facebook : facebook.com/chongmin.han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119특수구조단_ 한정민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