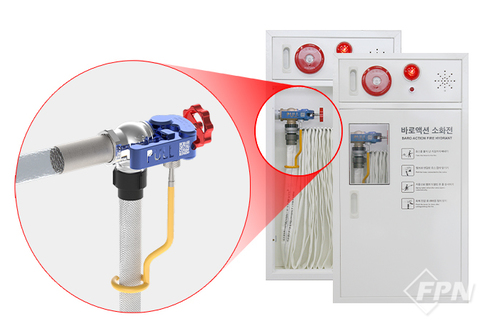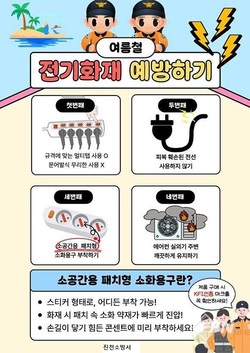|
중증 출혈 환자의 병원 전 단계 수혈 일반적으로 병원 전 단계에서 중증의 출혈 환자나 저혈량 쇼크 환자에게는 등장성 수액 투여로 볼륨을 늘리는 응급처치를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해외 사례를 보면 현장에서 바로 수혈하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항공 구급서비스(HEMS)와 공군 구조 헬기(SAR)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수혈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16건의 병원 전 단계 수혈 사례1)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외상으로 인한 중증 출혈로 매년 2만5천여 명이 병원 전 단계에서 사망한다. 총격으로 인한 외상환자 발생 빈도가 높아 현장 단계에서 수혈하는 걸 점차 늘려가고 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San Antonio)가 현장 수혈 프로그램2)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 혈액은행과 남부 텍사스 혈액ㆍ조직센터, 샌안토니오 소방서 등을 통합해 관리하는 STRAC(Southwest Texas Regional Advisory Council)가 주인공이다.
그중 샌안토니오 소방서(SAFD)는 인구 150만명을 담당하는 구급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데 2018년 10월부터 구급차에 혈액제제3)를 냉장 보관하고 있다.
수액 투여나 단일 혈액성분제제 투여로는 중증 출혈 환자의 저산소혈증이나 혈소판 기능 장애 등을 교정하기 어려워 전혈 수혈이 가장 좋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구급대원이 전혈 수혈을 하는 건 불법이다. 따라서 의사나 군 의무관이 구급차에 탑승해 현장으로 나가 적재된 혈액제제로 수혈한다.
적응증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상 또는 내과적 출혈성 쇼크 환자에게 수혈하고 있다.
a. 수축기 혈압 < 70㎜Hg b. 수축기 혈압 < 90, HR ≥ 분당 110회 c. ETCO2 < 25 d.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5분 미만 전, 출혈이 원인이거나 또는 출혈이 의심되는 심정지를 목격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는 경우 e. 연령 ≥ 65세ㆍSBP ≤ 100㎜Hg, HR ≥ 100회/분
2018년부터 운용된 샌안토니오 병원 전 단계 수혈 데이터의 후향적 분석 결과 병원 전 수혈은 병원 전 수혈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대량 수혈 발생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급실 사망률이 감소했고 입원 기간 사망률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었다.4)
한국에서 수혈이 필요한 중증 출혈 환자에겐 어떤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까? 대부분 정맥로를 확보하고 수액을 투여하면서 외상 센터로 가는 게 모범 답안일 거다.
하지만 외상 센터까지 30분 이상 걸리거나 구급차 내에서 출혈로 인해 심정지가 온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외상 센터로 이동하는 경로에 있는 병원에 들러 수혈하는 게 좋을까? 필자라면 이 방법을 선택하겠지만 아마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다.
원고를 쓰던 중인 4월 29일 대구 지역 10대 소녀가 4층 높이에서 추락했으나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휴일이나 새벽 시간도 아니었고 지방 소도시도 아닌 대구광역시에서 대낮에 일어난 사건이다. 전문의가 없어서, 응급환자가 많아서라는 이유였다. 병원 7곳에 전화로 문의했지만 모두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
환자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구급차에 탑승했으나 한 종합병원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숨졌다. 대한민국 중증외상 환자 응급의료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거다.
전문구급센터(Advanced EMS Station)의 필요성 필자는 수년 전부터 해외에서 운용되는 구급 지휘차와 구급 지휘관(구급대장)의 필요성을 SNS나 유튜브, 칼럼을 통해 알려왔다.
이를 계기로 부산 금정소방서에서는 2020년 제32회 119소방정책컨퍼런스에 ‘다수사상현장 MCI unit(구급 선제 대응팀) 도입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재고’라는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뿐 아니라 크고 작은 재난 현장에서 구급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됐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태원 사고 이후 뒤늦게 구급 지휘차의 도입이 시작됐으나 이것만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대형 재난, 대량 사상자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최근 대한민국이나 해외의 다수 사상자 사고 경향을 보면 재난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지고 복합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 감염병이나 자연 재난, 테러, 차량을 사용한 Ramming Attack(차량 돌진 공격)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 표출 등 소방 당국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현재의 구급 시스템으로는 이런 대형 재난이나 대량 사상자 사고, 전염병에 대비하기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흩어진 구급 자원을 모으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MCI 같은 다수 사상자 대응에 있어 구급대의 운영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 소방은 그간 많은 수의 구급대원을 증원하고 구급차를 증차하는 등 인적자원(소프트웨어)과 물적자원(하드웨어)을 증가시켜 구급의 Quantity(양)를 늘려왔다.
이젠 많은 구급 자원을 다수 사상자 사고나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단순히 구급차를 늘리고 고가의 구급 장비를 적재한다고 구급의 퀄리티나 다수 사상자 대응 능력이 높아지는 건 아님을 모두 몸으로 느끼고 있을 거다.
필자는 다양한 구급 시스템 중 미국이나 유럽의 ‘EMS Station’ 방식을 주목하고 싶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EMS Station’ 형태의 구급대 운용 시스템이 도입돼 있다. 권역별로 지역의 구급차가 모여있는 형태다.
구급 지휘차와 여러 대의 구급차가 같이 배치돼 있어 동시에 구급력을 집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수 사상자 현장 초기에 매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구급도 팀(Team) 단위 시스템 필요 1. 미국의 ‘Ambulance Strike Teams’, 영국의 ‘Hazardous Area Response Team’, 일본의 ‘도쿄 구급 기동 부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Ambulance Strike Teams/Medical Task Force Team 프로그램(AST/MTF)을 운영한다. 이는 CAL-MAT(캘리포니아 의료지원팀), 이동식 현장 병원(Mobile Field Hospitals) 등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재난 대응 프로그램의 필수 구성 요소 중 하나다.
우리말로는 ‘구급차 기동팀’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민간 구급업체 소속 전문소생 구급차5) 5대와 이를 통솔하는 리더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어디든 몇 시간 내에 배치될 수 있다. 게다가 최대 72시간 동안 재난 현장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소규모 다수 사상자나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처치ㆍ현장응급의료소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캘리포니아 지역 병원의 의료지원팀(CAL-MAT)이나 주 재난 요원과 협력해 현장 활동을 하기도 한다.
화재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현장에서 위험요소가 많아 구급대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지 못해 안전 지역(Cold Zone 또는 Warm Zone)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많은데 HART는 사고 발생 초기에 구급대원이 현장으로 직접 투입돼 환자 처치나 분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2005년 7월 7일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 사고에서 HART의 역할을 다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016년 6월 일본 도쿄 소방청에서는 구급 기동 부대를 발대했다. 특수 구급차를 포함한 고규격 구급차량 2대와 구급기동부대 총괄대장이 탑승하는 특수 구급차 1대, 구급대원 29명으로 구성됐다.
구급 기동 부대는 출동이 많은 시간대에 구급차를 전진 배치하거나 이동하면서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감염증이나 자연재해, 다수 사상자 현장 등 다양한 구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 사상자 사고나 대형 재난에서도 구급대가 구급지휘차와 구급대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덩어리처럼 팀을 이뤄 활동하는 게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겪었듯이 선착 구급대 1대 만으로 중증도 분류와 상황실과의 통신,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등 현장 활동을 동시에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1) Prehospital Whole Blood Transfusion Programs in Norway, Bjerkvig C.K.a 2) www.strac.org/blood 3) low-titer ORhD+ whole blood (LTO+WB)/흔히 Rh+O형으로 불리는 혈액 4) Prehospital whole blood reduces early mortality in patients with hemorrhagic shock, Maxwell A Braverman 5) ALS Unit(Advanced Life Support)라고 부르며 AEMT나 파라메딕이 탑승하는 구급차. 한국의 특별 구급차와 유사한 개념이다.
부산 해운대소방서_ 이재현 : taiji3833@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