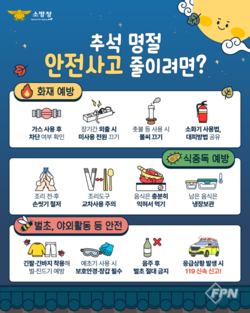[강경석의 리튬이온 배터리(LIB) 이야기] 리튬이온 배터리 플래시오버 노출에 대한 고찰- Ⅰ앞서 열폭주 기작에 관해 자세히 다뤘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배터리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해야 열폭주 현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 대응, 화재 조사 등을 올바른 방향성으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꼭 짚고 넘어가야 했다. 이번 호부터는 화재 조사 분야와 가까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비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화재 원인에 대해 과학적이지 않은 말들을 하곤 한다. 탄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눈으로 보며 원인을 해석할 수 있다면 과학계에서 신선한 관심과 트렌디한 연구로 주목을 받았을지 모른다.
더욱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는 셀들은 열폭주에 의한 손상인지 사후(Post-Fire) 손상인지 밝혀내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 답답함을 덜어내고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배터리 포렌식 분야에 대해 다뤄 볼까 한다.
독특한 특성을 단순한 분석에 의존
이번 호에서는 화재ㆍ안전 분야 국제 학술지인 ‘Fire Technology(IF: 2.4(2024))’에 2025년 5월 13일 정식 출판된 ‘Forensic Analysis of Multi‑Cell Lithium‑Ion Battery Packs Exposed to Flashover Fire Conditions’를 중심으로 보겠다.
화재 발생 지점 주변에서 발견된 리튬이온 배터리 혹은 팩 등이 화재 원인에 있어 발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반드시 신뢰성 있게 평가돼야 한다.
최근 화재 현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자주 발견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리튬이온 배터리 팩의 수집과 분석에만 초점을 맞춰 불완전한 접근법이 될 때가 많다.
또 여러 화재 조사관과 엔지니어는 특정 배터리 팩이나 셀이 화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화재 이후 셀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독특한 특성을 매우 단순한 분석에 의존한다.
화재 이후 손상된 리튬이온 배터리 데미지 분석에 관한 문헌은 제한적 NFPA 921 [2]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된 조사를 통해 발화 지점이 규명되면 해당 위치에서 발견된 리튬이온 배터리 셀과 다른 잠재적 열원은 화재에서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검토된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열이나고 화재에 노출돼 열폭주(Thermal Runaway)가 일어날 때 방출되는 열량에 관한 문헌은 많다[3–5]. 셀 내 의도적인 임의 단락 유도에 관한 연구 [6]와 열폭주 기작에 관한 연구 [7, 8]도 오래전부터 진행돼 그 결과가 보고된 분야다.
그러나 화재 이후 손상된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팩의 사후(Post-Fire) 손상 분석에 관한 문헌은 제한적이다.
여러 연구자가 화재 이후 리튬이온 배터리의 검사 방법론을 제시했다. 2022년 Hayes 등 [9]은 Mikolajczak 등 [10, 11]과 Horn 등 [12]이 제시한 방법을 확장한 연구를 발표했다. 저자들이 말하는 리튬이온 셀 화재 사고 이후 초기 평가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이 초기 평가 후 해당 방법론은 셀 자체에 대한 비주얼 검사ㆍ분석을 다룬다. 조사 목적에 따라 배터리 팩을 열어 셀의 잔여물, 인쇄 회로 기판, 보호 장치 등을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셀에 표시하고 전압을 측정해야 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X-rayㆍCT 스캔을 통해 관찰된 특징은 특정 셀을 발화 원인으로부터 배제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또는 대부분의 셀이 배제되더라도 남은 셀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경고한다 [9].
X-rayㆍCT 분석에서 평가되는 특징에는 셀 권선부의 용융된 손상과 권선 정렬, 내부 망울(beads) 형성, 가스 발생에 따른 흔적(배출ㆍ가스 포켓) 등이 포함된다. 필요에 따라 셀을 분해해 내부 검사ㆍ추가 분석(전기적 테스트, 재현 실험, 전극 검사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제시된 방법론을 뒷받침하는 테스트와 문서에서는 충전 상태(SOC)와 에너지 밀도가 열폭주를 겪은 리튬이온 셀에서 관찰되는 손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준다.
NFPA 921에 따른 화재 조사는 먼저 발화 지점을 규명하고 이어 발화 원인을 규명한다. 발화 원인이란 점화원과 최초 착화물, 산화제가 모인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NFPA 921이 제시하는 조사 방법 대신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리튬이온 배터리 팩만을 수집ㆍ분석하는 불완전한 조사 방식이 종종 사용됐다.
일부 조사관과 엔지니어는 화재 현장에서 회수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비주얼 검사로 분석하거나 X-rayㆍCT 스캔 손상 분석을 통해 특정 셀이 내부 결함 등을 일으켜 화재를 초래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보통 여러 특징을 비교ㆍ분석해 일부 셀을 배제한 뒤 남은 셀의 차이나 특성을 발화 지표(Causal Indicator)로 분류하는 방식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서 지목되는 발화 지표들은 상호 모순적인 경우가 많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문헌 [13]에 따르면 이러한 분석에서 ‘발화 지표’로 사용되는 많은 특징은 단순히 화재 노출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화재에 노출된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CT 스캔하면 가스 포켓이 없는 경우 평평한 바닥, 권선 이동이 거의 없는 경우, 국소적 손상 혹은 반대로 가스 포켓, 음극 끝부분의 팽창, 권선 이동, 내부 물질 배출, 권선부 다양한 지점의 손상 등이 모두 관찰될 수 있다 [13].
또 선행 연구에 따르면 리튬이온 셀의 SOC가 높을수록 열에 의한 열폭주 발생 시 발열률과 손상이 더 커진다 [14–16]. 리튬이온 배터리는 보통 팩 단위로 조립되는데 화재 현장에서는 팩이 그대로 있거나 개별 셀이 잔해 속에 흩어져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팩 내의 셀은 동일한 SOC를 갖는다. 따라서 화재 후 셀들의 손상 양상이 비슷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만약 서로 다른 손상 양상이 관찰된다면 이는 단순 화재 노출이 아닌 내부 결함이나 고장의 징후(즉 발화 요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SOC를 가진 18650 원통형 셀 배터리 팩을 플래시오버 이후 실제 규모(Room-Scale) 화재에 노출해 손상과 물리적 특징을 문서화하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화재에 노출된 멀티-셀 배터리 팩의 손상 정도를 확장해 기록하고 일반적인 조사 장비(X-ray, CT 등)를 사용한 셀 특성 기반 비교 분석이 특정 셀의 발화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실 규모 연소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ㆍ손상 분석 연구팀 실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실제 화재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제 크기의 방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에 사용된 배터리는 한 제조사에서 생산한 소니 노트북 배터리 팩 18개로 각각 9개의 셀이 들어있다. 배터리 팩들은 충전 상태가 서로 다른 세 그룹, 즉 SOC 10, 50, 100%로 나눠 준비한다.
1. 방 꾸미기와 배터리 배치
실험 장소인 연소실(Burn Room)은 약 3×4×2.4m 크기의 석고보드 구조물로 방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다. 방은 실제 침실처럼 꾸며졌으며 여기엔 퀸사이즈 침대, 협탁 2개, TV 거실 장, 작동 중인 천장 실링팬, 책상, 노트북 4대가 포함된다.
배터리 팩들은 방 전체에 걸쳐 다양한 높이로 배치됐다. SOC 10, 50, 100% 배터리 팩 각각 두 개씩, 바닥, 1.2m, 2.1m 높이에 놓았다. 각각의 배터리 팩에는 식별 라벨을 붙이고 화재 후에도 구성 요소를 모두 수거할 수 있도록 철제 케이지 안에 배치했다.
2. 화재 진행
점화가 시작되자 방 안의 모든 가연물이 불에 타기 시작했다. 침구, 매트리스, 박스 스프링, 상자, 의류, 협탁, 책상, 거실 장 등이 연소하면서 플래시오버가 발생했다.
방 입구와 내부에는 열전대 트리(Thermocouple Tree)가 설치돼 온도를 기록했다. 바닥에서부터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의 열전대를 설치해 방 내부 온도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화재 시작 약 8분 동안 650℃ 이상, 최대 982~1093℃까지 온도가 상승했다.
3. 배터리 팩 회수ㆍ분석 화재가 종료된 후 연구팀은 모든 배터리 팩을 회수했다. 회수된 배터리 팩은 손상 특성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사했다. 배터리 팩의 비주얼 검사는 전체와 개별 셀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했다. 용융 흔적, 셀 캔의 형태와 구조적 무결성, 권선 이동 여부 등을 평가했다.
각 충전 상태와 방 내 높이에 따라 대표적인 배터리 팩 샘플을 대상으로 X-ray, CT 스캔을 수행해 비주얼 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부 손상을 관찰했다.
참고 자료 [1] Li M, Lu J, Chen Z, Amine K (2018) 30 years of lithium-ion batteries. Adv Mater 30:1800561. https://doi.org/10.1002/adma.201800561 [2] NFPA 921 (2023) Guide to fre and explosion investigation [3] Liu X, Stoliarov SI, Denlinger M, Masias A, Snyder K (2015) Comprehensive calorimetry of the thermally-induced failure of a lithium ion battery. J Power Sources 280:516–525. https://doi.org/10.1016/j.jpowsour.2015.01.125 [4] Quintiere JG, Crowley SB, Walters RN, Lyon RE, Blake D (2016) Fire hazards of lithium batteries. Redmond, WA: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5] Roth EP, Doughty DH (2004) Thermal abuse performance of high-power 18650 Li-ion cells. J Power Sources 128:308–318. https://doi.org/10.1016/j.jpowsour.2003.09.068 [6] Finegan DP, Darcy E, Keyser M, Tjaden B, Heenan TMM, Jervis R et al (2017) Characterising thermal runaway within lithium-ion cells by inducing and monitoring internal short circuits. Energy Environ Sci 10:1377–1388. https://doi.org/10.1039/C7EE00385D [7] Finegan DP, Scheel M, Robinson JB, Tjaden B, Hunt I, Mason TJ et al (2015) In-operando high-speed tomography of lithium-ion batteries during thermal runaway. Nat Commun 6:6924. https://doi.org/10.1038/ncomms7924 [8] Finegan DP, Darcy E, Keyser M, Tjaden B, Heenan TMM, Jervis R et al (2018) Identifying the cause of rupture of li-ion batteries during thermal runaway. Advanced Science 5:1700369. https://doi.org/10.1002/advs.201700369 [9] Hayes TA, Cohn AP, Kasse RM, Sanchez H (2022) Advanced lithium-ion battery failure analysis—An evolving methodology for an evolving technology, Pasadena, California, USA. pp. 51–57. https://doi.org/10.31399/asm.cp.istfa2022p0051. [10] Mikolajczak C, Harmon J, Hayes T, Megerle M, White K, Horn Q, et al. (2008)Li-ion battery cell failure analysis: The signifcance of surviving features on copper current collectors in cells that have experienced thermal runaway, Fort Lauderdale, FL, p. 61–79. [11] Mikolajczak CJ, Hayes T, Megerle MV, Wu M (2007) A Scientifc Methodology for Investigation of a Lithium Ion Battery Failure. In: 200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rtable Information Devices, Orlando, FL, USA: IEEE, p. 1–6. https://doi.org/10.1109/PORTABLE.2007.53. [12] Horn Q, Hayes T, Slee D, White K, Harmon J, Ramesh G et al (2011) Methodologies for battery failure analysis. In: Reddy TB, Linden D (eds) Linden’s handbook of batteries, 4th edn. McGraw-Hill, New York [13] Nagourney T, Jordan J, Marsh L, Scardino D, May BM (2021) The Implications of post-fre physical features of cylindrical 18650 lithium-ion battery cells. Fire Technol 57:1707–1722. https://doi.org/024810.1007/s10694-020-01077-8 [14] Alexander J. Hofmann, Michael T. Burr, Erik M. Swonder, Donald J. Hofmann (2021) TForensic Analysis of Multi‑Cell Lithium‑Ion Battery Packs Exposed to Flashover Fire Conditions. Fire Technol. https://doi.org/10.1007/s10694-025-01751-9 [15] Mikolajczak C, Kahn M, White K, Long RT (2011) Lithium-ion batteries hazard and use assessment. Springer, Boston. https://doi.org/10.1007/978-1-4614-3486-3 [16] Kurzawski A, Gray L, Torres-Castro L, Hewson J (2023) An investigation into the efects of state of charge and heating rate on propagating thermal runaway in Li-ion batteries with experiments and simulations. Fire Saf J 140:103885. https://doi.org/10.1016/j.fresaf.2023.103885
경기 하남소방서_ 강경석 : youeks@naver.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10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경석의 리튬이온배터리(LIB) 이야기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